리 호이나키, [아미쿠스 모르티스](부희령 옮김), 도서출판 삶창,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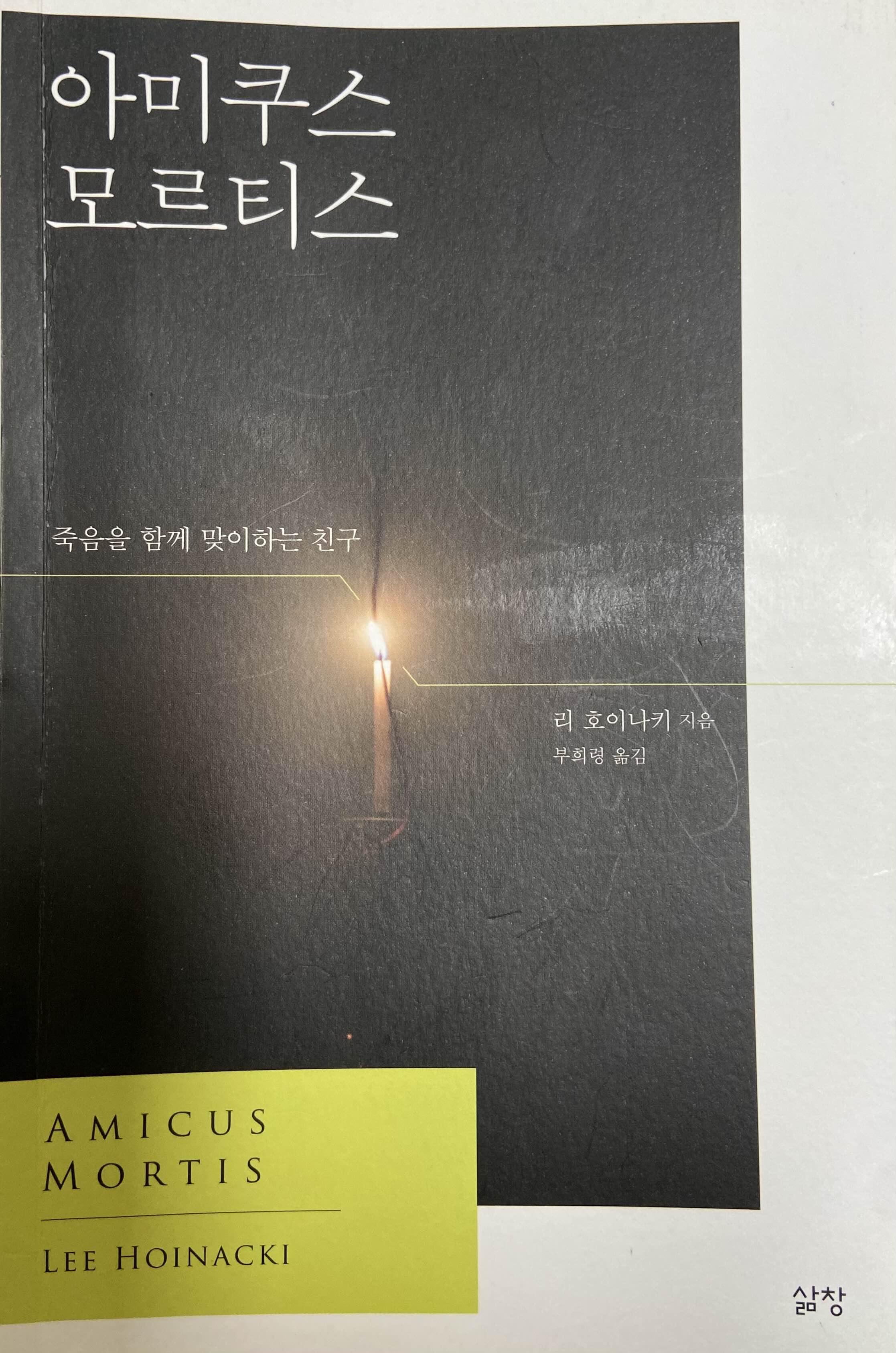
( 197~ 200쪽)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시몬 베유의 글을 읽고 또 읽어왔다. 비록 그녀의 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녀의 책이 나의 책장에서 내려온 적은 없었다. 때때로 진실을 꿰뚫은 빛나는 통창력은 나의 둔한 감성에 충격을 주곤 했다. 그리고 일리치가 죽은 뒤에 나는 새로운 눈으로 그녀의 글을 읽었다. 진실 중 유일하게 여기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의 진실이다. 일리치가 죽은 2002년 12월 2일 이후의 시간 동안 시몬 베유를 읽으면서, 나는 일리치가 겪은 고통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인 그녀의 에세이 [신의 사랑, 그리고 고통]은 내가 읽은 어떤 글보다도 신자들이 경험한 고통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진다. 내가 본 것과 일리치가 느낀 것과 관련된 시몬 베유의 글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나는 시몬 베유가 쓴 것과 일리치가 겪은 고통을 더욱 예민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인생의 위대한 수수께끼는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인 고뇌를 느끼는 것이다. 순수한 이들이 살해당하고, 고문당하고,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궁핍해지고, 노에가 되고, 수용소나 감옥에 감금되는 것은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고통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질병이 긴 괴로움을 주는 것도, 자연이 자비와는 관련 없는 기계적인 필요로 움직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신이 순수한 이들의 절대적 지배자로서 그들의 영혼을 가져가고 소유하기 위해 그들에게 고뇌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고뇌에 낙인찍힌 이는 고작해야 자신의 영혼 절반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이 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스스로 고뇌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고뇌를 겪은 사람을 알지 못했다. 내가 시몬 베유를 읽으며 느낀 바를 염두에 두고 일리치의 삶을 생각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놀라운 연관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인격 속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든 십자가에 접근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는 일리치가 모든 신자들의 삶에 있는 십자가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 이따금 언급한 것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일리치의 모습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시몬 베유, 일리치,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있는 이러한 진실을 온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그녀의 어떤 말들은 십자가의 신비에 직접적으로 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을 모방하는 일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모방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넘어서려면, 신을 모방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십자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금욕주의나 영웅주의를 선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십자가는 선택할 수는 없다. 십자가는 형벌의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장 순수하게 가혹한 고통은 형벌의 고통이다. 고통의 본질을 보증하는 고통이다.
그리스도는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어나게 했지만 그것은 겸손하고 인간적인 일이었고 그의 소명에 있어서 매우 작은 부분이다. 진짜 초자연적인 부분은 피로 땀을 흘린 일, 인간의 위로에 대한 충족되지 않는 갈망,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애원, 하느님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다.
시몬 베유는 십자가 위의 주님이 했던 말이자 찬송가의 첫부분이 된 말을 인용한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마태 27:46).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쓴다. “여기에 기독교가 신성하다는 진정한 증거가 있다.”
일리치의 경우, 종양으로 인한 고통이 그를 고뇌의 경험에 이르게 했다. 비엔나에서 겪은 학교 교장과의 굴욕적인 대면도, 그 자신에 상처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 그보다 그는 자신의 밖에서 의미를 찾아내곤 했고, 이 경우에는, 십자가에서 의미를 찾았다. 이런 이유로 생육신 안에서 십자가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그의 글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그의 끔찍한 고통,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외로운 고통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리고 주님과 맺은 이러한 관계가 그에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총, 힘을 주었다.
성 바오로의 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일리치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넣고 다니는 것에 대단한 영향을 느꼈다. 그가 고통과 혹을 받아들인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 만약 그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거부했다면, 매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의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진실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신자’라는 걸어 다니는 모순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믿음에는 비용이 따른다. 몇 년 전에 일리치는 이렇게 썼다.
전통적인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위해나 슬픔의 충격으로 행하는 일에 책임지도록 만들었다. 고통은 우리 몸의 주체적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된다. 몸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찾고, 그에 대한 의식의 반응으로 몸은 끊임없이 형성된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두통, 장애, 슬픔을 스스로 치유하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종양이 자라나는 모든 시간 동안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괴로운 나머지 가끔 큰소리로 신음하고 가벼운 불평을 하긴 했지만 방항심을 보이진 않았으며, 당연히, 전혀 분노하지도 않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가 몸부림쳤던 것에 대한 시몬 베유의 언급을 생각해보면, 일리치의 고뇌어린 질문들이 내가 잠들고 그가 혼자 있을 때, 주님과 그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때 생겼으리라고 짐작했다.
'문화 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 내맡기오 (1) | 2025.01.18 |
|---|---|
| 내 안의 연한 부분이 소리 없이 깨어졌다 (2) | 2025.01.10 |
| 고통에 귀 기울이는 일 (19) | 2025.01.02 |
| 극한 노동의 응축, 멸치액젓 (3) | 2024.12.13 |
| 빛과 실 (4) | 2024.12.11 |